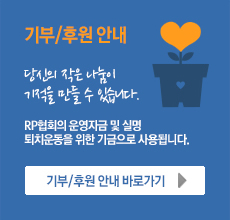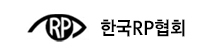HOME / 커뮤니티 / 자유게시판


-

진행이 느리다고는 하지만.. 
피터 
2011/06/01 
1,148 **그냥 넋두리하는 글이고, 읽고 우울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이오니 미리 양해바랍니다.** 저만 그런게 아니겠지만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'10년 전에는 내 눈상태가 어땠지?' 10년 전이면 주어진 일터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더랬습니다.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해도 눈이 꽤 괜찮았었습니다. 시장길을 지나야 하는 그 복잡한 길도 별 문제없이 다녔고, 늦은 시간 지하철이 중간에 끊겨서 밤길을 2시간 걸어서 집에 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. 출판작업을 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, 교정작업을 하느라 필름이나 교정지의 작은 글씨도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알피가 참 무섭긴 무섭네요. 지금은 돋보기 안경을 써도 신문 읽기가 힘드네요. 시사주간지 읽기는 용지 때문인지, 글씨체가 좀더 두꺼워서 그런지 볼만은 한데 신문 읽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어서 이젠 신문 보는 건 포기해야할까 싶네요. 아는 사람하고 만나려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도 이젠 부담이 됩니다.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는게 걱정됩니다. 늘 다니는 길들은 그런데로 다닐만 한데, 가끔 전혀 모르는 길을 가야 할 때는 한참을 헤매게 되네요. 마트나 집 앞 빵집에 가서 뭔가를 골라 사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, 이발을 하려고 헤어샵에 가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. 건널목에서 좌우로 두리번 거리고,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도로에 그려져 있는 흰 선을 따라 시선을 마치 모니터에 마우스 찾듯이 해야 합니다. 이제는 길을 갈 때 제 몸을 붙잡고 길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. 요새는 "눈이 어두워진다"는 말이 '아, 정말 맞는 말이구나!' 싶습니다. 정말 어둑어둑해 지는 거 같습니다. 가능한한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하고,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, 한 두 시간 산책도 꾸준히 다니고, 약도 잘 챙겨먹고 합니다만 진행형은 역시 진행형입니다. 모래시계가 한 알 한 알 밑으로 빠지듯이 말이죠. 게시판에 이런 저런 사연에 "힘내세요!", "용기를 가지세요", "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", "좀만 더 견뎌봐요"라는 답글들이 달립니다. 물론 그래야 하고, 분명 그럴 겁니다. 다른 이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나 자신을 다잡아야 할 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10년 전의 제 눈상태는 사실 정상인들에 비해서라면 한참 모자란 것일테지만 그때의 눈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의 차가 다른 병이라 연세가 꽤 있으셔도 여전히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떤 분은 젊은 데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전 어중간한 거 같습니다.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. 분명 치료가 될거라 믿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인고의 터널을 빨리 지나기만을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. 새벽시간에 잠도 안 자고 이런 글이나 쓰고 있네요.ㅋ 처남이 새벽에 들어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버려서..;;